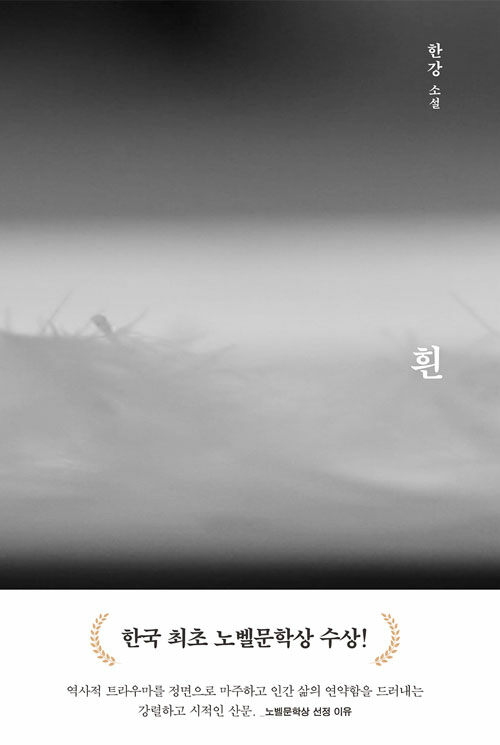
『흰』1)은 작가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2014년 5월에 출간한 뒤 아들을 데리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머물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다. 작가는 바르샤바 봉기2) 박물관에서 2차 대전 후 1945년 미국의 공군기가 촬영한 영상에서 독일군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된, 잿빛 잔해만 남은 바르샤바 구도시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도시 위에 재건된 현재의 모습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닌 채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깊은 영감을 받는다.
한강은 예전부터 흰 것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고 하면서, 강보, 배내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련, 흰 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 개, 백발, 수의 등의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책을 시작한다. 책은 크게 세 장으로 나뉘는데, 1장 나, 2장 그녀, 3장 모든 흰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라는 일인칭 화자가 이끌어가는 장편소설인데 책의 구성은 마치 산문시를 모아놓은 것처럼 제목과 짧은 글들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드문드문 빈구석들이 있는데 촘촘하게 채우지 않아서 그런지 독자로 하여금 더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나'는 낯선 도시의 그 방에 짐을 풀고 더럽고 핏빛같이 녹슨 그 방의 철문을 하얀 페인트로 덧칠하다가 문득 내리는 하얀 눈을 본다. 하얀 눈을 멍하게 보다가 하얀 강보에 싸인 어린 아기를 떠올리고, 첫서리가 내린 겨울날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신의 언니가 될 수 있었던 달떡같이 하얀 얼굴의 아기, 그녀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이처럼 이야기는 내가 현재 겪는 상황 속에서 흰 것을 만났을 때 느낀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나의 기억 속 깊숙한 다른 흰 것을 들춰내면서 현재와 과거가 새끼줄처럼 엮어진다.
'내'가 머무는 바르샤바는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저항군이 점령국 독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곳이다. 그 후 바르샤바는 70년간 이어진 복원 사업을 통해 현재의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작가는 도시 건물의 오래된 아랫부분과 새 것인 윗부분의 경계를 보면서 "파괴를 증언하는 선들"(29쪽)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도시처럼 한차례 죽었거나 파괴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과거의 잔해들 위에 끈덕지게 스스로 복원해서 이상한 무늬를 지니게 된 사람에게로 시선을 가져간다.
이야기는 만약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가 죽지 않고 악착같이 계속 살았다면 그래서 그 아기 아니 그녀가 나 대신 이곳에 왔었더라면 어떨지 그려보면서 이어진다. 말하는 주체가 '나'에서 '그녀'로 바뀐다. 죽음의 흔적을 지닌 그녀가 비슷한 상흔으로 얼룩진 도시 한복판을 걷는다. 강한 바람이 도시를 감싼 안개를 걷어버린다. 나는 그녀의 등장으로 복원된 새 건물 자리에 폐허가 드러나고 죽은 영혼들이 우뚝우뚝 몸을 세우고 눈을 뜰 수도 있다고 상상한다. '파괴를 증언하는 선들'을 지닌 이들을 위해 나는 그들에게 흰 것을 주겠다고, 더럽혀지더라도 주겠다고,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겠다고 말한다. 오직 흰 것들 곧 내 삶 전부를 말이다.
이 책에 나오는 흰 것들에 대한 단상을 읽다 보면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어머니와 아버지, 만나지 못한 언니, 잠깐 키우던 흰 개, 남동생의 결혼식 등 한강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빈번하게 언급되는 흰 것으로는 겨울, 서리, 흰 눈, 눈송이, 진눈깨비, 차가운 것, 얼음, 바다, 파도 등인데 이 기억들과 어둠, 새벽, 별들, 흐릿한 불빛 등 어스름하고 불투명한 이미지들이 같이 놓여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흰 것들임에도 글을 읽다 보면 흰 빛깔처럼 밝고 환하다기보다는 바다 심연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개인적으로는 '언니'에 대한 살뜰한 글이 마음에 남았다. 나도 맏이라서 어렸을 때 가끔씩 언니나 오빠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주변 친구들에게서 언니랑 새 옷을 먼저 입겠다고 싸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언니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이는 언니가 없었던 작가의 이상이 아닌가 싶다.
한강은 삶과 죽음,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한다. 태어난 이상 누구나 살고 싶다. 갓난아기의 귓가에 "제발 죽지 마라"라고 간절하게 말하던 목소리는 어쩌면 생명력 자체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닌가 한다. 살자,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억울한 죽음을 보았다. 전쟁과 같은 거대한 폭력 앞에 무력한 개인들은 흩날리는 눈발처럼, 부서지는 파도의 물결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내 삶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내준다면 죽음은 죽음으로,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아직 살아 있다면, 지금 나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가 살아 있다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만, 그 파르스름한 틈에서만 우리는 가까스로 얼굴을 마주 본다."(117쪽)
작가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옅은 빛이 새어 나오는 틈새로 만날 희망을 말하는 것 같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작가는 오늘을 사는 나는 먼저 간 이들에게 빚진 자임을, 그들이 미처 다 살지 못한 생을 지금 내가 이어받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성찰한다. 나의 전체를 '당신'에게 내어줄 때, 즉 당신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입으로 말할 때 세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펼쳐진다. 죽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내가 들이마실 때(135쪽) 그렇게 그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은 의미로 가득 찬다.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흰 것이다.
----------------------
1) 한강, 『흰』, 문학동네, 2016.
2) 바르샤바 봉기(폴란드어: powstanie warszawskie)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바르샤바를 독일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폴란드 국내군이 일으킨 일제 봉기이다. 바르샤바 봉기는 1944년 8월 1일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소련 붉은군대가 독일군을 몰아내며 바르샤바 동부 외곽으로 접근하던 것과 시기를 같이했다. 그러나 소련군은 바르샤바 코앞에서 진격을 멈추었고, 그 사이 독일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폴란드 봉기군을 진압했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는 63일 동안 바르샤바는 독일군의 잔혹한 진압 아래 파괴되었다. 바르샤바 봉기는 제2차 세계 대전 저항운동사에서 최대 규모의 단일 군사행동이다. 바르샤바 봉기 때 발생한 사상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폴란드 저항군 중 16,000여명이 죽고 6,000 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폴란드 민간인이 150,000 ~ 200,000명 죽었다. 독일군의 가택수색으로 일부 폴란드인들이 보호해 주고 있던 유대인들이 노출되기도 했다. 독일군 사상자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해서 8,000명 이상이고 부상자는 9,000여명이었다. 시가전을 거치면서 바르샤바의 건물 4분의 1이 파괴되었다. 폴란드 저항군이 항복한 뒤에도 독일군은 남은 도시의 35%를 또 파괴했다. 바르샤바 봉기의 주도세력인 폴란드 국내군과 지하국은 봉기 실패로 완전히 와해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군이 버리고 떠난 바르샤바를 소련군이 접수한 이후 그 지도부는 NKVD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94%EB%A5%B4%EC%83%A4%EB%B0%94_%EB%B4%89%EA%B8%B0
